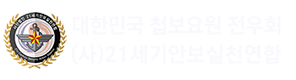자유게시판
 미군 장교가 말하는 판문점 근무 8년
미군 장교가 말하는 판문점 근무 8년
공작새
0
3,255
2023.05.01 16:34


2018년 만난 김여정, 옆자리서 팔 만져…주변서 ‘여자친구’냐며 놀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유엔군 사령부 소속으로 DMZ에서 8년간 근무한 미 해군 퇴역장교 대니얼 에드워드 맥셰인 전 소령이 가장 어색했던 순간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DMZ 근무 기간중 가장 어색했던 순간으로 2018년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만났을 때를 꼽았다.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러 판문점을 찾았는데, 회의 장소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웃으며 팔을 가볍게 만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판문점에 근무하던 군인들이 김 부부장이 ‘여자친구’냐며 자신을 놀리기도 했다고 맥셰인 전 소령은 떠올렸다.
그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판문점에서 최장기간 근무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남북 관계를 몸소 체험했다.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현장에서 지켜봤고, 전 세계 마지막 남은 냉전의 화약고에서 머리털이 쭈뼛 서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판문점에 주둔한 일부 미군은 스스로를 ‘DMZ의 명랑한 미친 승려’라고 부른다고 했다. 고립되고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복무하는 것은 수도원에 사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요리 모임을 조직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골프 코스’ 에서티오프를 했다. 3면이 지뢰로 둘러싸인 파 3홀이다.
맥셰인 전 소령은 판문점 근무를 시작할 당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털어놨다. 근무 첫날 밤 주변에서 지뢰 한 발이 터졌고, 이튿날엔 두 개가 폭발했다는 것이다.
DMZ에는 지뢰 200만 개가 흩뿌려져 있다. 맥셰인 사령관은 “문화적 충격이었다”고 전했다.
그의 일과 중 하나는 오전 10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직통전화로 북한 측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대부분은 “풀 깎는 작업 중이니 (오인해서) 쏘지 말라”는 식의 일상적 대화였다고 한다.
북미 양국 장교들이 판문점에서 가끔 마주치면 야구 얘기 같은 사적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북한군은 미국 과자 도리토스와 한국의 초코파이를 좋아했다고 맥셰인 전 소령은 말했다.
맥셰인 전 소령은 판문점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흰색 개를 약 2주간 돌봐줬더니 어느 날 자연스레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측 지역인 판문각으로 들어가 미 장교들 사이에서 “개가 북한 간첩이었다”는 농담이 나온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DMZ내 분위기가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2015년 DMZ를 순찰하던 한국 육군 하사 2명이 북한 목함지뢰에 중상을 입었을 때와, 2017년 북한군 병사가 총격을 뚫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했을 때는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판문점 주변의 기류도 얼어붙었다고 회고했다.
맥셰인 전 소령은 당초 2019년 6월 말 판문점 근무를 마치고 퇴역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19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깜짝 만남’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일정은 물거품이 됐다.
그날 상사로부터 “짐을 풀라. 대통령과의 셀카는 금지”라는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기 때문이다.
그는 그때부터 정신없이 정상회담 준비를 했다고 한다. 몇 시간 뒤 북한 장교들이 수십 개의 북한 인공기를 들고 나타났는데, 맥셰인이 가진 미국 성조기는 3개뿐이어서 급히 해병대 헬리콥터가 서울로 날아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성조기를 조달해오는 일도 있었다.
현재 평택 미군기지에서 다친 미군 병사들에게 기타를 가르치는 그는 DMZ에서 자신이 목격한 남북한 데탕트가 “너무 짧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맥셰인 전 소령은 2018년 4월 당시 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 공동으로 심은 ‘평화와 번영의 나무’가 “죽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로 남북 간 화해·협력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고 NYT는 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유엔군 사령부 소속으로 DMZ에서 8년간 근무한 미 해군 퇴역장교 대니얼 에드워드 맥셰인 전 소령이 가장 어색했던 순간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DMZ 근무 기간중 가장 어색했던 순간으로 2018년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만났을 때를 꼽았다.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러 판문점을 찾았는데, 회의 장소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웃으며 팔을 가볍게 만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판문점에 근무하던 군인들이 김 부부장이 ‘여자친구’냐며 자신을 놀리기도 했다고 맥셰인 전 소령은 떠올렸다.
그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판문점에서 최장기간 근무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남북 관계를 몸소 체험했다.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현장에서 지켜봤고, 전 세계 마지막 남은 냉전의 화약고에서 머리털이 쭈뼛 서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판문점에 주둔한 일부 미군은 스스로를 ‘DMZ의 명랑한 미친 승려’라고 부른다고 했다. 고립되고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복무하는 것은 수도원에 사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요리 모임을 조직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골프 코스’ 에서티오프를 했다. 3면이 지뢰로 둘러싸인 파 3홀이다.
맥셰인 전 소령은 판문점 근무를 시작할 당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털어놨다. 근무 첫날 밤 주변에서 지뢰 한 발이 터졌고, 이튿날엔 두 개가 폭발했다는 것이다.
DMZ에는 지뢰 200만 개가 흩뿌려져 있다. 맥셰인 사령관은 “문화적 충격이었다”고 전했다.
그의 일과 중 하나는 오전 10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직통전화로 북한 측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대부분은 “풀 깎는 작업 중이니 (오인해서) 쏘지 말라”는 식의 일상적 대화였다고 한다.
북미 양국 장교들이 판문점에서 가끔 마주치면 야구 얘기 같은 사적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북한군은 미국 과자 도리토스와 한국의 초코파이를 좋아했다고 맥셰인 전 소령은 말했다.
맥셰인 전 소령은 판문점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흰색 개를 약 2주간 돌봐줬더니 어느 날 자연스레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측 지역인 판문각으로 들어가 미 장교들 사이에서 “개가 북한 간첩이었다”는 농담이 나온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DMZ내 분위기가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2015년 DMZ를 순찰하던 한국 육군 하사 2명이 북한 목함지뢰에 중상을 입었을 때와, 2017년 북한군 병사가 총격을 뚫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했을 때는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판문점 주변의 기류도 얼어붙었다고 회고했다.
맥셰인 전 소령은 당초 2019년 6월 말 판문점 근무를 마치고 퇴역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19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깜짝 만남’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일정은 물거품이 됐다.
그날 상사로부터 “짐을 풀라. 대통령과의 셀카는 금지”라는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기 때문이다.
그는 그때부터 정신없이 정상회담 준비를 했다고 한다. 몇 시간 뒤 북한 장교들이 수십 개의 북한 인공기를 들고 나타났는데, 맥셰인이 가진 미국 성조기는 3개뿐이어서 급히 해병대 헬리콥터가 서울로 날아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성조기를 조달해오는 일도 있었다.
현재 평택 미군기지에서 다친 미군 병사들에게 기타를 가르치는 그는 DMZ에서 자신이 목격한 남북한 데탕트가 “너무 짧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맥셰인 전 소령은 2018년 4월 당시 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 공동으로 심은 ‘평화와 번영의 나무’가 “죽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로 남북 간 화해·협력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고 NYT는 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